기후위기 시대, 강을 사유하다 | 강, 다시 자연으로
- sungmi park
- 8월 1일
- 3분 분량
2025-07-30 정리 박성미 총괄
[편집자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은 댐 건설을 추진하며 자연을 통제하려는 반면 유럽은 댐 철거를 통해 강 복원에 나서는 등 상반된 물 정책을 펴고 있다. 최민욱, 염형철, 정수근, 김복연 네 필자는 플래닛03의 기사를 통해 '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4대강사업'을 되돌아보게 했다. '개발' 중심의 물 정책에서 벗어나 강을 '문화이자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물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아픈 경험을 통해 자연을 도구화하는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지금, 강을 다시 사유하며 '강의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복연, 정수근, 최민욱, 염형철) <본 기사는 본지에 실린 '강' 관련 기사 중에서 발췌했다.>
4대강 사업이 남긴 것, 물의 정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한국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자원 개발 사업이었다.
정부는 홍수 예방, 가뭄 대응, 수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총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사업은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전국의 주요 강에는 16개의 보(Weir)가 설치되었다. 준설이 이뤄졌고, 제방이 높아졌으며, 자전거길과 수변공간, 레저시설이 강을 따라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철저히 ‘인간 중심의 자연 이용 논리’에 기반했다. 흐르는 강을 조절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고,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강은 더 이상 스스로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할 때 물을 저장하고, 넘칠 때는 차단하며,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소비되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강은 마지막 야생의 공간, 뭇 생명들과 함께 살아야

2009년부터 지난 16년 동안 낙동강과 전국의 강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이명박 정부가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행한 국가 폭력과도 같은 강 개발 사업은 강을 죽음으로 내모는 동시에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피맺힌 절규의 장이 되게 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흐름을 거세당한 강은 썩어갔고, 얕고 잔잔히 흘렀던 강은 수심 6미터 이상의 깊은 물웅덩이가 돼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거나 삶터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는 녹조와 서식처 파괴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만 13년 동안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물이 담수가 된 2012년 바로 그해 여름 4대강에 번성한 녹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고 경악케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경단체와 하천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바 그대로 강의 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기후댐'을 쌓는 나라, '댐'을 철거하는 나라

유럽에서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Dam Removal Europ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16개 국에서 325개의 수중 구조물이 철거됐고, 2023년에는 15개 국에서 487개의 장벽이 제거됐다. 2024년에는 23개 국에서 542개의 댐과 보가 철거돼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다수는 저수댐과 같은 소규모 구조물이지만, 본격적인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형 댐 철거도 이어지고 있다. 철거에 처음 참여한 국가도 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터키가 처음으로 댐을 철거했다.
가장 많은 철거를 진행한 나라는 핀란드였다. 2024년에만 138개의 장벽이 제거됐고, 프랑스는 128개, 스페인은 96개, 스웨덴은 45개, 영국은 28개를 철거했다. 철거된 구조물의 78%는 높이 2m 미만의 소형 구조물이지만, 노후화된 대형 수력발전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조벤코강에서는 5개의 보가 제거돼 수십 년간 막혀 있던 하천 흐름이 회복됐다.
'개발' 관점에서 '문화' 관점으로

정책의 퇴행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다. 2000년대 생태 중심으로 발전하던 물 정책이 다시 1970년대 치수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댐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상하수도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방식이었다. 4대강사업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다.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수질 개선은 거의 정체 상태다. 물 공급량도 과잉 상태가 되었다. 당시 국민 1인당 필요한 물의 양보다 2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정수 시설이 늘어났다. 현재는 시설 일부를 폐쇄해서 1.5배 수준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과잉 공급 체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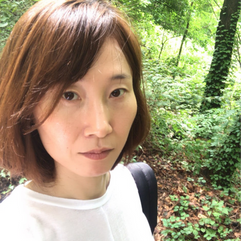












플래닛03 화이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