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기후시민의회, 기후위기가 불러 낸 새로운 민주주의
- Dhandhan Kim
- 2025년 11월 4일
-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8일
2025-11-04 김복연 기자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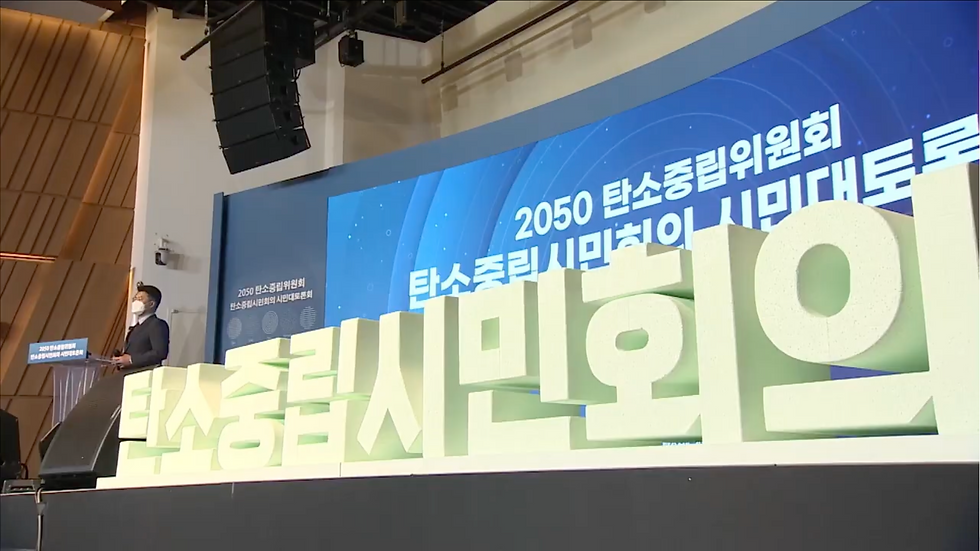
‘숙의민주주의’의 등장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를 지나며 이 당연시되던 구조는 균열을 드러냈다. 선거가 끝나면 시민의 참여는 종료되고, 정치의 무대는 정당과 전문가가 차지했다. 공공정책은 이해관계의 경쟁장이 되었고, 장기적 공익보다는 단기적 표 계산이 앞섰다. 이런 한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다. 숙의민주주의는 “좋은 결정은 좋은 대화에서 나온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다수결의 절차를 넘어, 서로의 이유를 듣고 충분히 토론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본다.
“숙의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유를 이해하려는 과정이다.”
— 위르겐 하버마스, Between Facts and Norms
1970~1980년대 북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러한 발상을 실험으로 옮겼다. 덴마크의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와 미국의 ‘숙의형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며 공동의 판단을 만들어 내는 초기 모델이었다. 이 실험이 훗날 시민의회의 씨앗이 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험, ‘기후시민의회'
‘기후시민의회(Climate Citizens’ Assembly)’라는 이름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유럽이었다. 가장 먼저 아일랜드가 2016년 시민의회를 구성해 낙태, 동성혼, 기후 정책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뒤이어 프랑스는 2019년 ‘노란조끼 시위’ 이후 정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실험으로 ‘기후시민회의(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e)’를 출범시켰다. 150명의 시민이 9개월간 토론을 이어가며 149개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비록 다수가 제도권의 벽에 막혀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이 경험은 시민이 기후 정책에 중요한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국(2020)과 독일(2021)도 뒤를 이었다. 영국의 '영국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는 108명의 시민이 ‘2050년 넷제로 사회’를 위한 길을 모색했고, 독일의 '기후시민평의회(Bürgerrat Klima)'는 160명의 시민이 국가 기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럽의 기후 시민의회들은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하는 새로운 민주적 제도 실험으로 주목받았고 시민이 여론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학습하고 판단을 형성해 결정을 제안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급격하고 광범위하며 복잡한 기후위기 대응에서 있어 시민의회의 필요성은 분명했다.
구분 | 프랑스 🇫🇷 | 영국 🇬🇧 | 독일 🇩🇪 |
공식 명칭 |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 Climate Assembly UK | Bürgerrat Klima |
명칭의 의미 | ‘시민협약(Convention)’ — 행정부 위임형 | ‘시민의회(Assembly)’ — 의회 위촉형 | ‘시민평의회(Council)’ — 시민사회 주도형 |
운영 주체 | 대통령 직속 기후위원회 | 영국 의회 | 시민단체 + 학계 연합 |
참여 시민 수 | 150명 | 108명 | 160명 |
숙의 기간 | 9개월 | 6개월 | 3개월 |
참여 방식 | 무작위 선발 + 인구 비례 반영 | 무작위 선발 + 대표성 고려 | 무작위 + 자발적 참여 병행 |
결과물 | 149개 권고안 → 일부 입법화 | 50개 권고안 → 의회 보고 | 국가 기후 로드맵 권고 |
정치적 영향력 | 정부 공약 반영 약속 → 일부 미이행 | 의회 토론 반영, 선택적 수용 | 정책 반영률 높음, 제도화 논의 중 |
시민의 기후 정책 논의 참여, 한국의 ‘기후시민회의’
시민의 기후정책 논의 참여는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기후시민회의, 2022년 경기도 기후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두 지역 모두 시민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행정 주도의 일방적 결정 구조가 아닌 '기후시민회의'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례가 여전히 ‘의견 수렴형 회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아쉬운 점은 의제를 정하는 주체가 행정이었고, 시민은 미리 정해진 주제를 논의하는 역할로 규정되었다. 논의의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남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한국어 명칭 | 영어 대응 | 개념 요약 |
기후시민회의 | Climate Citizens’ Conference | 시민 참여로 의견을 모으는 공개토론 (참여 중심) |
기후도민총회 | Climate Convention | 시민 전체의 합의와 결의 (합의 중심) |
기후시민의회 | Climate Citizens’ Assembly | 시민이 직접 정책 방향을 결정 (결정 중심) |

경기도의 도전, 숙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회의'에서 '의회'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다. 경기도는 2024년 운영했던 '기후도민회의'를 발전시켜 2025년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를 출범시켰다.
경기기후도민총회 https://ggclimate.kr/

도는 기존 회의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기구였다고 밝히며, 새로운 총회는 도민 120명이 참여해 '의제 설정–학습–숙의–권고안 제출'의 단계를 갖춘 숙의형 기구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총회의 결과 보고와 권고안 반영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행정 주도의 ‘회의형’ 구조에서 시민의 학습과 토론, 의제 설정권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실험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무작위성', 시민의회의 가장 민주적 특징
기후시민의회가 처음 제안됐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된 의문은 이것이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과연 국가의 중대한 기후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있을까?”
전문가도, 선출된 대표도 아닌 시민이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구조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무작위성(random selection)'이 시민의회의 가장 민주적인 특징이자 강점이다.

선거는 언제나 조직된 집단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정당, 이익단체, 자본이 정치의 통로가 된다. 반면 무작위 추첨은 사회 전체의 구성을 통계적으로 반영한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소득 수준이 실제 인구 비율에 근접하기 때문에, 청년·여성·저소득층·농민 등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시민의 목소리가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OECD는 시민의회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구성 방식이 기존 정당정치가 대변하지 못한 대표성을 복원한다고 분석했다. (OECD,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2020)
기후 정책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시민의회의 또 하나 큰 우려는 ‘전문성 결여’다. 기후 정책은 과학·기술·경제·제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이다. 비전문가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시민의회는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가와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와 현실적 적용의 방향을 토론한다.
영국의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에서는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숙의 수준은 참여 전보다 평균 40%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 정책의 합리성은 전문가에게서 비롯되지만, 그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회는 이 두 축을 연결해 지식을 ‘소유’가 아닌 ‘공유’의 형태로 사회화하는 제도다.
기후 정책은 ‘공동의 선택’이 되어야
기후위기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다.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농업·산업·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 정책은 여전히 ‘위로부터’ 설계된다. 행정이 의제를 정하고, 전문가가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은 정책의 수용자 역할이다. 이 구조로는 사회적 합의도, 지속가능한 실행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기후시민의회는 이 결핍을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 결정의 권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시민과 행정이 책임을 나누며 기후 정책을 ‘지시’가 아닌 ‘공동의 선택’으로 바꾸는 일이다.
기후시민은 가장 작은 기초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지역 단위의 시민의회는 의미가 더욱 크다. 기후위기의 피해와 적응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며, 정책의 실효성도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목포, 순천, 산청, 울산 같은 도시들이 각자의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행정의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역의 기후시민의회는 주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학습하며,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지자체와 함께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후시민'은 지금부터 길러져야 하며 지역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져와
기후시민의회는 정책의 보조 장치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던 사회는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로 대전환 중이다. 민주주의의 질문은 이제 “누가 대표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로 변해야 한다. 그 전환이 이뤄질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후시민의회는 정책의 보조 장치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던 사회는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로 대전환 중이다. 민주주의의 질문은 이제 “누가 대표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로 변해야 한다. 그 전환이 이뤄질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